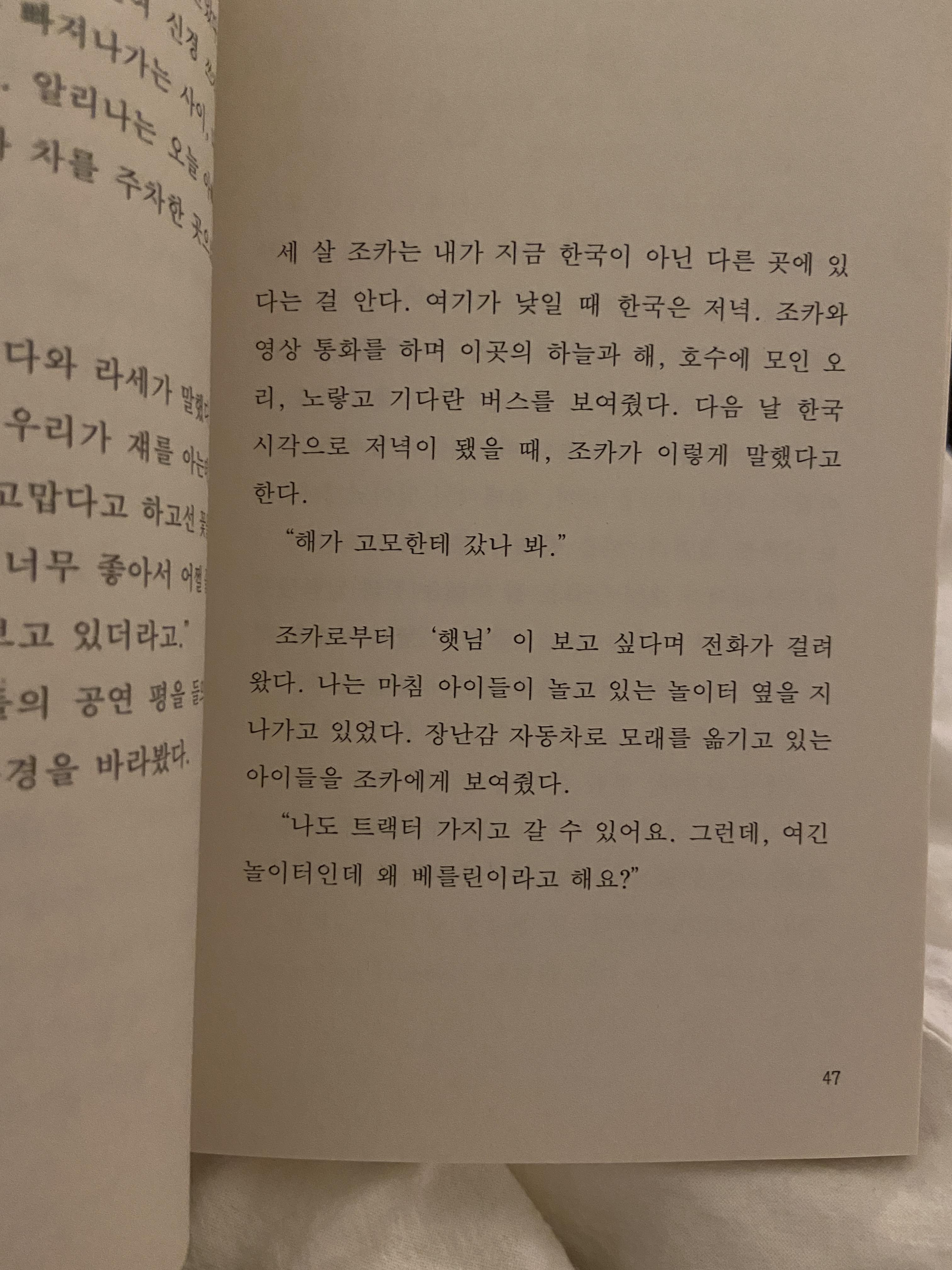마지막이 될 줄 몰랐던 5년 전 만남을 끝으로 나는 이따금 그를 떠올리기만 했다. 가벼운 몸과 간소한 차림새, 점심시간마다 챙겨오던 소박하고 맛있는 도시락, 일하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만들어 마시던 몸짓들, 혼자 간 씨네큐브 옆자리에서 우연히 그를 만난 일. 종종 생각이 났고 연락처도 있었지만 연락할 이유가 없었다.
그에게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만나기로 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꽤 낭만적인 것으로 여겼다. 함께 일했던 사이지만 우리는 어떤 곳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오랜시간 서로를 떠올리기만 하는 건 인스타그램이 생긴 후론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 됐으니까.
씨네큐브에서 본 영화가 무엇이었는지, 영화를 보고 나와 순대국밥을 먹었는지 아닌지, 각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지니고 있던 기억들을 맞대보며 많이 웃었다. 5년간의 일들도, 그것으로 달라진 것들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상할만큼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동안 베를린에 있었고 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함께 살게 되면 적당한 책임감을 보여주겠습니다. 시간을 공유하고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집 안에서 말없이 그냥 앉아있을 수도 있겠죠.” 쉐어하우스를 구하며 쓴 자기소개처럼 그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적당함을 아는 사람이다. 낭만을 이어가려면 계속 연결되지 않아야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연결되는 편을 택하고 헤어졌다.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몇번 더 만나는 게 적당할까.